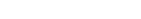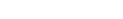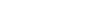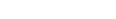| 제목 | 항생제와 면역질환의 증가 | ||||
|---|---|---|---|---|---|
| 작성자 | 닥스메디 | 등록일 | 2021.7.16 | 조회수 | 135749 |
|
항생제와 면역질환의 증가
‘항생제 남용’ 인한 장내 세균교란이 원인
“항생제는 인류가 겪어온 질병과 의학의 역사에서 걸출하고도 독보적인 위치고
20세기 의료의 가장 위대한 공헌자이기도하다.”
바너드가 쓴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19세기 말까지 가장 발달한 유럽에서도 위생과 질병의 연관성은 감지되지 못했다.
의사들 역시 다른 부유한 유럽인들처럼 손도 거의 씻지 않았다.
피 묻은 앞치마는 외과의사들의 전문적인 기술의 상징이었고 붉으면 붉을수록 좋았다.
그러다 1846년 제멜바이스라는 헝가리 외과 의사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생존율이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관찰했다.
의사들이나 병원이 임산부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것’을 옮기고 있다고 지목한 것이다.
자신들이 병을 옮긴다는 고발에 격분하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멜바이스는 병동에서 현대적인 손 씻기를 도입했다.
놀라운 점은 이후 산모의 사망률이 30%에서 1%로 떨어졌다.
병의 원인은 이처럼 작은 곳에 있었다.
1865년에 이르러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미생물이 실제로 감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것을 세균(germ)이라고 불렀다. 이른바 병원세균설(germ theory of disease)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다 1928년 플레밍에 의해 푸른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1940년 항생제 대량생산에 성공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부터
부상병들의 치료에 페니실린이 이용되면서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냈다.
또한 항생제(antibiotics)라는 말을 처음 쓴 왁스만에 의해 결핵균 치료제인
스트렙토마이신이 1943년에 발표되고, 20세기 후반 여러 제약회사들이 퀴놀론계열이나
세파스포린계열 등 더 강력한 항생물질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비로소 항생제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래서 항생제가 한참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던 1960년대 노벨상까지 수상한
호주의 감염학자 맥파렌 버넷은 “항생제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21세기에
모든 감염질환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렇지만 항생제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위 그림을 제시했다.
지난 50~60년간 결핵과 같은 감염질환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면역질환은 반대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주위를 보면 20~30년 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아토피나
천식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2011년 논문(박용민 저)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아토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1995년 7.3%에서 2010년 24.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 그림은 New EnglandJournal of medicine에 2002년 게재됐던 Bach의 연구를 재구성한 것이다.
NEJM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저널이다.
피인용횟수를 근거로 해서 매기는 impact factor가 2015년 기준으로 55인데,
유명한 과학잡지 science가 33정도이니 그 권위가 짐작될 만하다.
Bach의 이 논문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대체 건강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항생제의 남용이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성장을 억제한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 병을 일으키는 세균만 콕 집어 죽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항생제에게는 그런 구분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병원성 세균뿐 아니라 우리 몸에 상주하고 있던 세균,
즉 꼭 필요한 박테리아도 함께 죽는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종의 다양성을 잃고 콜레스테롤 흡수능력, 비타민 생산능력, 음식물 분해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Power의 2014년 논문에서 소장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사는 대장에 이르면
한 번의 항생제 투여로 3분의 1 이상이 몰살당한다고 나와 있다.
심지어 대변에서 조차 세균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그렇게 격변을 거친 세균들은 항생제 복용 후 설사나(antibiotics associated diarrhea) 대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버려진다. 그런 세균총안에서의 불안정(dysbiosis)이 발생하게 되면
반대로 또 살판나는 세균이 있다. ‘씨 디피실’이라는 세균인데, 이들이 일으키는 설사때문에
미국에서만 연간 수만명이 목숨을 잃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최대한 항생제를 먹지 않아야 한다.
꼭 필요한 세균성 감염에만 그것도 가능하면 세균의 정체를 감수성 검사 같은 방법으로 알고 난 다음
그 세균에 살균력이 있는 항생제를 먹어야한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 많은 항생제들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항생제는
여러 균에 살균력을 가지는 광범위 항생제가 많다. 그만큼 장내 여러 상주 세균들을 죽인다.
장내 세균이 교란되면 장내 세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이 유지되는
장 상피세포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진다. 그렇게 되면 몸속으로 흡수되지 말아야 할
여러 독소나 물질들이 체내로 들어오는데, 이른바 ‘장누수증후군(Leaky gut syndrome)’이다.
흡수된 여러 물질들은 몸의 약한 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토피나 천식 같은 면역성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항생제를 꼭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프로바이오틱스로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
항생제로 몰살당한 장내 세균총을 유익한 미생물을 넣어 줌으로써 복원시켜 주는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논하겠지만 Lactobacillus rhamnosus나 효모가 항생제 투여 전, 후 사용하면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줄 일 수 있다.
명 선 의 료 재 단 이 사 장 김 혜 성 |
|||||